[공감] 말의 시대, 글의 힘
- 가
이국환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말보다 글이 생각을 담기 좋아
글쓰기 자기 성찰의 효과 있어
요즘 문자 소통 글 격식 없어
소통, 상대방 위한 배려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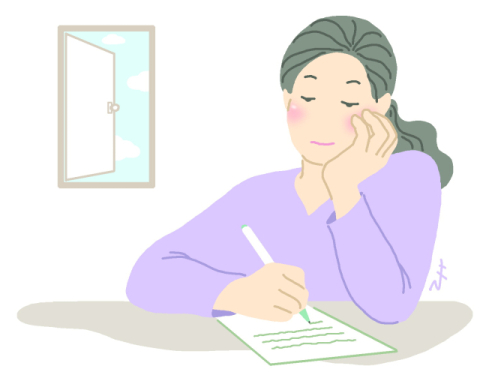

말이 난무하는 시대, 유창한 말로 주위를 압도하는 능변가들이 주목받는 시대에, 나는 여전히 망설임과 머뭇거림의 눌변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말보다 글이 좋다. 발화는 순발력을 요구하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전하기 어렵다. 언어란 생각을 실어 나르는 수레인데, 내 마음을 오롯이 담지 못하면 수레가 방향을 잃거나 가끔 듣는 이와 충돌하기 마련이다.
화종구생, 본디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 부부 갈등도 그 시작은 대개 말로부터다. 어느 날 아침 고기 없는 밥상이 차려졌다. 남편이 투덜댄다. 내가 소도 아니고, 맨날 풀만 주면 어떻게 일하냐고. 그러자 아내가 되받는다.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오면 한우 등심에 보리굴비도 매끼 주지요. 그러면 남편은 벌어온 돈 다 어디 썼냐며 화를 내고, 티격태격 가시 돋친 말들이 서로에게 날아가 박힌다. 싸움의 발단은 온데간데없고 말이 낸 생채기만이 연고를 발라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된다.
글로 쓰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모든 글의 최초 독자는 글쓴이 자신이기에 써놓고 읽으며 자신의 언행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쓰기는 자기 성찰의 성격을 지니며 곡진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된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글쓰기는 수필 갈래이다. 일기, 편지, 학생들이 중시하는 논술까지 대부분의 글쓰기를 갈래로 보면 수필이다. 수필은 워낙 방대한 하위 갈래를 포함하고 있어 문학 작품이면서도 일상적인 글쓰기이기도 하다.
지난 학기 수필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후기가 좋았다.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시간” “삶의 태도와 생각의 깊이를 넓혀준 소중한 시간” 등의 후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학생들은 작가와 독자의 경험을 함께하는 한시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인간으로 성장하는 수업”을 만들어 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논리정연함을 요구하는 로고스와 감정의 풍부함을 추구하는 파토스와 함께 에토스를 강조했다. 에토스는 글쓴이의 성품과 윤리, 태도를 의미한다. 글 뒤에 존재하는 글쓴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글이 에토스가 좋은 글이다. 수필은 글쓴이가 글 뒤에 숨을 수 없는 갈래다. 소설이 허구 뒤에, 시는 모호함 속에 숨을 수 있으나 수필은 글쓴이가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글이 곧 그 사람이 되며, 좋은 사람이 좋은 글을 쓴다.
아내와 나는 신혼 초 갈등이 심했다. 살아온 환경과 성격, 취향이 너무 달랐다. 자꾸 마음결이 어긋나 사소한 다툼이 이어졌고, 우리는 고민 끝에 말이 아닌 글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지금이라면 문자를 주고받았겠지만, 편지로 생각을 정리하며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우리 부부에게는 다름으로 시작된 신혼 갈등을 글의 힘으로 극복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글의 전성시대 같다. 문자나 SNS 등으로 소통하며 말보다 글이 더 익숙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글은 음성언어가 문자로 기록된 것일 뿐, 글이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가 결여되고 편지처럼 격식을 갖추어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 얼핏 격식이라 하면 너무 딱딱하고 불편한 인상으로 다가오지만, 글쓰기에서 격식은 읽는 이를 향한 존중과 배려를 뜻한다.
소통의 진정성은 상대를 위해 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노력을 전제한다. 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마거릿 애트우드는 〈글쓰기에 대하여〉에서 “글 쓰는 삶은 끈질긴 낙타 같은 것”이라고 전한다.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는 건, 막막한 사막을 포기하지 않고 건너는 것과 같다. 끈질긴 퇴고 과정에서 작가는 비로소 독자가 되며, 글쓰기의 퇴고 과정은 내가 남이 되어보는 연습이 된다. 서툰 초고를 퇴고하듯 우리 마음도 퇴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퇴고한 마음이 상대 마음 문을 조심스레 연다. 말의 시대, 글의 힘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