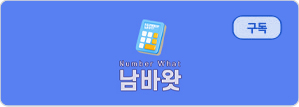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허동윤의 비욘드 아크]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바람
- 가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도시에서의 고민은 항상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에 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성장동력 사이에서 역사를 보존하고 개발의 해법을 찾는 것, 공공성을 지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는 건축가에게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과제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건축주와 수많은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하물며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리적, 역사적 조건 외에도 개발과 확장은 때때로 공간을 단절시킨다. 그로 인해 도심은 파편화된다. 부산은 그러한 단절과 재구성이 반복된 도시다.
부산의 철도 노선은 일제강점기 이후 도시 구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도시가 성장한 이후 철도는 도시 공간을 단절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철도가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생긴 물리적·사회적 단절은 도시 내 이동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다.
부산역~부산진역 2.8km 구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원도심 회복의 중요한 계기 마련
도시 구조 재편하는 시발점 돼야
북항재개발만 해도 그렇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은 원도심 통합재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북항재개발 지구와 산복도로를 연결해 단절된 도심을 이어야 하는데 부산역 조차장이 부산역과 원도심, 그리고 북항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연계 개발이 어려웠다. 지난 2월, 부산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원도심 연결사업의 길이 열렸다. 선도사업 구간은 부산역에서 부산진역까지 2.8km 구간이다. 이 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 원도심은 과거 부산의 중심지였다. 남포동과 중앙동, 부산역, 초량 일대는 물류와 상업의 중심이었고, 사람과 문화가 뒤섞이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원도심은 점차 쇠퇴했다. 도시의 핵심 기능이 이전하면서 활력이 넘쳤던 원도심은 빈 점포와 노후 건물이 증가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지하화는 원도심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철도 부지의 상부를 인공지반(데크)으로 덮어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시는 인공지반 위는 공공주택과 공원, 문화시설 등 복합 용도로 활용하고 부산진 CY는 부산신항으로 이전시킨 후, 그 부지에 상업·업무지구를 복합해서 첨단산업지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업부지가 국공유지와 철도공단 소유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 리스크가 적다 해도 유휴부지의 상업성이 얼마나 보장될지가 관건이다.
해외에서도 철도 부지의 상부를 인공지반(데크)으로 덮어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철도차량기지 위에 인공지반을 덮고 상업, 업무, 주거, 공원을 조성한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와 철도 부지를 덮어 인공지반을 형성해 그 위에 업무지구와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도심 내 공간 활용도를 높인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 그리고 철도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상업, 업무, 주거, 공공시설이 혼합된 공간으로 개발한 일본 신주쿠 복합터미널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유럽 교통망 연결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는 환경문제 관련 시위, 예산 초과 및 투명성 논란, 정치적 논란 등으로 1994년 공식 발표된 이후 예산 초과와 지연을 반복했다.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목적과 함께 유서 깊은 중앙역을 모두 철거하고 수백 년 된 나무들을 자르는 문제가 원인이었다. 2010년 착공 이후 공사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되어 2026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슈투트가르트 21’은 공공의 참여와 투명성, 그리고 개발과 보존 간의 균형을 위해 참고할 사례로 볼 수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부산시가 함께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부산역 조차장 일원이 북항 2단계 개발사업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 북항 2단계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와 별개로 추진될 경우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심 역할은 부산시가 해야 한다. 쇠퇴한 원도심 통합재생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지리적 단절은 해소됐는데 자칫 사회적 단절을 가져올까 걱정이다.
철도 지하화는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길을 찾고, 파편화된 도심을 다시 통합해 잊힌 공간에 새로운 생명과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