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형균 TP 원장 "조직 내 인권, 젠더 감수성 높이고 적정기술로 시민 삶 파고들 것"
- 가
 김형균 원장.
김형균 원장.
“지-산-학-연을 맺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기술이 시민 삶 깊숙이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원장과 대다수 직원이 공학을 전공한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와의 ‘융합’은 어떤 모습일까. 신임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을 지난 19일 부산 강서구 지사단지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에서 만났다.
“지역 대학의 위기, 지역 산업의 위기, 나아가 지방 소멸의 위기입니다. 지금 TP에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는 ‘지-산-학-연’(지자체-기업-대학-연구소)을 잘 매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부산시장과 중소벤처기업장관도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부산TP를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다. 김 원장은 TP는 전형적인 ‘B2B(Business to Business)’ 기관 아니냐는 물음에 “이제부터는 몇몇 사람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C2B2C(Consumer to Business to Consumer)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요구와 아이디어가 TP로 와서 기술 구현이 되고 다시 시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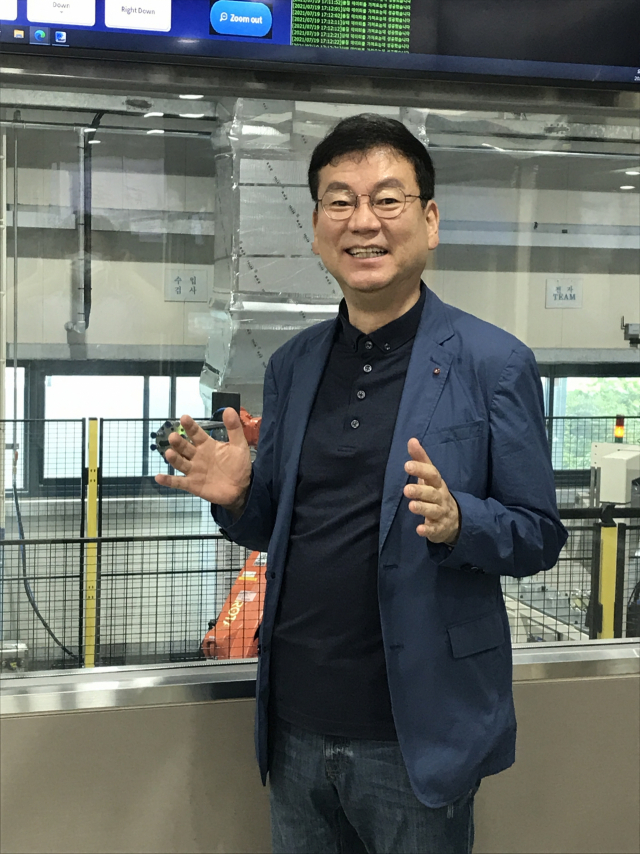 김형균 원장
김형균 원장
그 연장선에서 김 원장은 소외계층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산복도로에 사는 주민들의 난방비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보다 더 많이 드는 예를 들어보죠.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난방비를 적게 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게 적정기술이죠. 부산에서도 물만 넣으면 되는 휴대용 수력발전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TP 구성원들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많은 기술을 개발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적정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경실련과 협력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조직 내에서도 TF 운영을 통해 사회공헌 분야를 챙기겠다고 했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을 위해서도 적정기술 개발은 꼭 필요하고 TP의 전문성과도 맞아떨어진다.
“조직이 생긴 지 22년입니다. 이 정도면 규정과 제도, 축적된 역량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잘 굴러갑니다. 문제는 조직문화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문화는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김 원장은 사실 취임사부터 ‘조직 문화’를 연신 강조했다. “TP 직원이 222명이에요. 한 해 수행하는 과제는 230건, 예산은 2000억 원에 가까워요. 시 출자 출연기관 중 가장 크죠. 이 공들여 쌓아 올린 조직이 잘못 물꼬를 튼 조직문화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린 여러 사례를 봐왔잖아요.”
김 원장은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과 젠더 감수성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노동권익전문기관과 여성인권전문단체에 긴급컨설팅을 맡길 예정이라고 했다.
“조직 규정상 성평등에 관한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고 여의치 않으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군 여중사 사건에서 본 것처럼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은 조직 비호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외부 컨설팅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생각했어요. 필요하면 지속적인 관리도 받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매뉴얼도 마련할 겁니다.”
 김형균 원장.
김형균 원장.
이 모든 것들은 부산TP 내부 혁신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것들이다. 위원회는 직원과 외부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고 기관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일을 한다.
김 원장은 인터뷰 내내 “TP가 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원장 임명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부산연구원과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출신이라는 이력과 TP를 연결 짓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지-산-학-연 매개와 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생각해보면 연결이 된다.
“구슬이 서 말인데, 꿰어지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지역 사회에서 이만한 기술 역량을 가진 집단이 있을까 싶은데 시민들에게 각인되지 못하고 있어요. 수출입국처럼 기술입도가 되는데 TP가 앞장섰으면 좋겠고, 시민들도 그 과정에서 TP라는 든든한 조직이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 원장은 부산에 혁신기술역사전시관이 생겼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고 당장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나중 필요할 때를 대비해 TP 기술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부산 사람들은 과거부터 새 기술에 대한 친화적인 기질이 있어서 기술 개발에 능하고 기술 수용력도 높아요. 부산에서 기술로 시작해 대기업이 된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태 기업이 부산에 있었던 LG, CJ, 태광 등과 잘 협력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