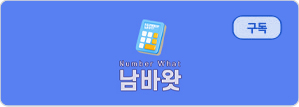밭, 골목… 이런 곳도 전시장이라고?
- 가
밖_앝 기획 전시, 7월 6일까지 정관 밭
비주류사진관 사회참여전 무기한 전시
“단순 전시 감상 넘어 일상 공존 확장”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전시 모습. 사진은 최은희 작가의 '바깥의 회화'. 밖_앝 제공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전시 모습. 사진은 최은희 작가의 '바깥의 회화'. 밖_앝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nas/wcms/wcms_data/photos/2025/07/01/2025070105144978325_l.jpg) 비주류사진관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전시는, ‘화이트큐브’로 대표되는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 미술 전시장의 개념에서 벗어난 이색적인 전시 공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특정 건물이 아니다 보니 찾는데 약간은 헤맸다. ‘밖_앝’ 전시장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333-2’로 지번까지 치고도 갈림길에서 ‘밭지기’ 송성진 작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재차 확인한 뒤에야 제대로 도착했다. 영도구 봉래동을 가로지르는 중복도로에 위치한 봉산마을 ‘비주류사진관’ 일대 골목 전시장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시를 기획한 정남준 대표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평일엔 생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일로 야외 전시장을 찾지 못해서 지난 주말에야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전시장 입구 비닐하우스 모습. 김은영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전시장 입구 비닐하우스 모습. 김은영 기자
■기장 정관읍 밭에서 여는 기획전
‘밖_앝’ 전시 공간은 들리는 그대로 ‘바깥’이거나 ‘밖과 밭’이다. ‘밖_앝’에서 여는 전시는 햇수로 3년째이다. 시각예술가인 송성진 작가가 2023년 개인 작업에 필요해서 직접 깻잎 농사를 짓기로 하고 두명마을의 버려진 밭 약 2310㎡(700평)를 임대한 게 출발이다. 그러다 부산문화재단의 예술가치 확산 지원 ‘상시’ 사업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다른 작가들과 함께 야외 전시 프로젝트를 꾸렸다.
올해는 작가들과 본격적인 텃밭 농사도 짓고 있다. 참여자가 24명으로 늘었다. 지난 주말 두명마을을 찾았을 땐 한 고랑씩 차지한 작가들의 밭에서 고추 가지 고구마 옥수수 등이 무럭무럭 자라는 중이다. 송 작가는 특히 염주 팔찌를 만들 수 있는 율무 열매를 얻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심은 율무 10주에서 종자까지 받아서 올해는 무려 150주를 심었다고 기뻐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기획자 중 한 명인 송성진 작가. 김은영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기획자 중 한 명인 송성진 작가. 김은영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으로 마련한 올해 전시 ‘공생물성’은 스페이스 사랑농장과 밖_앝 공동 기획으로 지난달 5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 이어진다. ‘공생물성’은 단순한 생물 간 공존을 넘어, 예술을 통해 생태적·형태학적 관계망을 감각하고 재구성하는 시도로 주목된다. 참여 작가는 김등용, 김보경, 양나영, 어밍, 이승희, 이자연, 이지연, 오미자(이가영, 김성진, 김학수), 조정현, 최은희 등 10명(팀)이다. 이들은 설치, 조형, 회화, 영상 작업 등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전시 모습. 사진은 오미자 그룹의 '共 굴리기'와 송성진 작가. 김은영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전시 모습. 사진은 오미자 그룹의 '共 굴리기'와 송성진 작가. 김은영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전시 모습. 사진은 오미자 그룹의 '共 굴리기'. 김은영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공생물성' 전시 모습. 사진은 오미자 그룹의 '共 굴리기'. 김은영 기자
오미자 그룹의 ‘共 굴리기’가 눈에 띄었다. 채집한 풀과 자연 재료로 만든 공을 관객이 직접 굴리며 전시장을 체험하는 참여형 설치 작품이란다. 중간 오프닝이 있던 지난달 21일엔 참석자끼리 팀을 나눠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며 신나게 놀았다고 한다. 흙에서 태어나 생명을 다한 것 같은 풀이지만, 그들을 엮고 잇고 굴리고 영차영차 땀 흘리며 웃는 동안 그 속에서 떨어진 씨앗은 또 다른 생명으로 환생할 것이다. 짚풀로 만든 공은 더욱 단단해지면서 부피는 줄고 있다.
 조정현 작가의 '새:아파트'. 김은영 기자
조정현 작가의 '새:아파트'. 김은영 기자
조정현 작가의 작업 ‘새:아파트’는 각목, 합판, 지푸라기로 만든 5층짜리 ‘아파트’이다. 맨 위를 움푹 파서 빗물이라도 고이면 새들이 가끔 와서 먹어주기를 바랐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아파트가 새들에게도 편한 장소가 못 되었는지 거의 오지 않더라고 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공생물성'을 기획한 송성진 작가. 김은영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마을 밖_앝에서 열리고 있는 '공생물성'을 기획한 송성진 작가. 김은영 기자
 최은희 작가의 '바깥의 회화'. 김은영 기자
최은희 작가의 '바깥의 회화'. 김은영 기자
밭 위로 설치한, 평균대 높이의 나무로 만든 길이 45m가량 펼쳐졌다. 그 나뭇길 끝에는 ‘바깥의 회화’라는 이름으로 최은희 작가의 예술 작품 보존 실험이 한창이다. “이번 작업은 자연의 환경 안으로 회화를 내어놓는 시도입니다. 비와 바람, 햇빛과 온도, 습도와 같은 자연의 물리적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작업의 전제이며 목표”라는 게 송 작가의 설명이다. 작가는 보존이 아닌, 경험의 회화를 제안하고, 훼손 자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란다. 이미 1점은 때마침 열린 한 아트페어 전시장으로 옮겨갔다.
 김등용의 '이슬 드로잉' 설치 작품. 김은영 기자
김등용의 '이슬 드로잉' 설치 작품. 김은영 기자
 어밍 작가 설치 작품. 김은영 기자
어밍 작가 설치 작품. 김은영 기자
이 외에도 이슬이 증발하며 남긴 흔적을 작업화한 김등용의 ‘이슬 드로잉’, 자연의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김보경의 설치 ‘획’, 텃밭 생태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 이승희의 ‘새를 위한 그릇’, 어밍의 태양 빛 추적 영상 설치 ‘해와 눈을 마주쳐 보라’ 등이 전시되고 있다.
그는 왜 밖_앝 전시장을 운영하는 걸까. “전시가 단지 감상의 차원을 넘어 일상의 공존으로 확장되는 현장이 새롭잖아요. 희한하게 제 경우는 미술관 전시가 아니면 참여 기회가 거의 드문 것도 새 전시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했고요.” 전시는 자유 관람으로 쉬는 날은 없다.
 비주류사진관 제32회 사회참여전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골목길 전시 모습. 김은영 기자
비주류사진관 제32회 사회참여전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골목길 전시 모습. 김은영 기자
![비주류사진관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nas/wcms/wcms_data/photos/2025/07/01/2025070105145010924_l.jpg) 비주류사진관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nas/wcms/wcms_data/photos/2025/07/01/2025070105145126926_l.jpg) 비주류사진관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아지트 앞에서 포즈를 취한 정남준 대표. 김은영 기자
비주류사진관 아지트 앞에서 포즈를 취한 정남준 대표. 김은영 기자
■봉래동 골목길에서 여는 사진전
‘비주류사진관’이 주관하는 제31회 사회참여전 ‘[삶을 잇는] 골목 사진전’(5월 3일~ )과 제32회 사회참여전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6월 14일~ )는 봉래동 골목 전역(부산 영도구 외나무길 73)에서 무기한으로 열리고 있다. 과거 조선소 노동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살았던, 좁고 오래된 골목길에서 열리는 사진 전시이다. 참여 작가는 대부분 비주류사진관 소속 멤버이다.
봉산마을만 해도 꽤 많은 빈집이 있다고 했다. 비주류사진관이 둥지를 튼 곳도 빈집이었고, 그 앞으로, 옆으로 빈집이 점점 늘고 있다. 골목 입구에서 시작해 비주류사진관 아지트가 있는 앞마당 빈집 외벽에는 수리조선소 작업 현장을 담은 대형 걸개 사진이 걸려 있다. 2023년 5월에 이곳에 들어와 처음으로 연 전시 때 사용한 그림이다. 골목길 전시도 어느새 서너 번에 이른다. “배너 천에 인쇄하는 거는 수시로 바꿉니다. 이게 최장 6개월은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실내가 아닌 야외이고 햇볕과 비바람에 색이 바래잖아요.”
 비주류사진관 제32회 사회참여전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2회 사회참여전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2회 사회참여전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2회 사회참여전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2회 사회참여전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비주류사진관 제32회 사회참여전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시 모습. 정남준 제공
골목 전시도 하다 보니 차츰 요령이 생겼다. 처음엔 대형 걸개그림 형태였는데, 최근엔 포맥스 액자(50cm*35cm)로 만들어 골목 외벽에 붙였다. 비를 맞아도 끄떡없다. 특히 32회 사진전은 총 77컷의 다양한 초상들이 낡고 오래되고, 빈 골목들 벽 곳곳에 펼쳐져 있다. 이 사진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 주거, 공동체를 소환하는 의미이자 언어로서의 사진 곧 사회적 발언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다. 사진 속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도 최근 다녀갔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도 왔다 갔다.
“더 이상 사람들이 점점 살지 않는 골목에 온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빈집이 늘면서 골목도 죽어버리니까요. 사진으로, 그것도 사람의 초상으로 채우면서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김은영 기자 key66@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