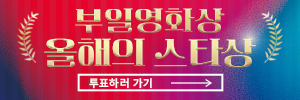남포동역에서 투신한 40대 의대생
- 가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남포동 역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곧 열차 운행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15분. 약속시간에 늦을세라 헐레벌떡 뛰어 지하철역에 도착했더니, 안내원의 목소리가 지하도에 울려 퍼진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연신 교통카드를 표 보이는 곳(개찰구)에 댔다가 땠다가 한다. 지하철 플랫폼 입장을 제한하는 표시로 빨간 불이 번쩍인다. 급히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빨간 불이 커졌다. 평일 저녁, 그것도 퇴근 시간인 6시 이후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꽉 막힌 도로에 갇힌 버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냥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부산 지하철 장전역 모습>
나 역시 지하철을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동생에게 늦을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늦음’에 대한 후속 조처를 취했다. 그러다 문득 어젯밤(14일) 티비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다. 장전 역에서 60살 장애인이 투신 자살을 했다는 보도였다. ‘이틀 연속으로...’
10여 분이 지난 6시 25분쯤.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 중 한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대화를 무심결에 듣다 조금 구슬퍼졌다.
아주머니: “버스 타면 늦을 것 같아서 지하철 타러 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저씨: “남포동 역에서 사람이 뛰어 들었다네요.”
아주머니: “아이고, 버스 탈 걸 그랬네요. 일부러 빨리 가려고 지하철에 왔는데...”
아저씨: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겨야 되요.”
아주머니: “누구한테 매깁니까? 이미 사람은 죽고 없는데...”
아저씨: “가족들한테라도 벌금을 매겨야 함부로 안 죽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줄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살할 용기로 그냥 살아가면 좋을텐테...”
퇴근길, 만원의 지하철, 혼잡, 불편, 벌금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다. 전날 뉴스에서는 60대 장애인의 자살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했고, 15일의 지하철 사상 사고 보도도 마찬가지였다.
40대 의대 졸업생이 의사 고시를 통과하지 못해 비관을 했고, 정신적 질환을 앓아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와 함께 여지없이 따라오는 “20여 분간 최근 시간 한 때 ‘혼잡’이 벌어졌다”는 보도 형식.
한 사람의 죽음이 ‘혼잡’과 ‘불편’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잊혀져가고 있다. 그들은 왜 하필이면 지하철에 뛰어드는 선택을 해야 했고, 왜 그랬을까? 이런 연민 섞인 고민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치일까? 지하철 투신도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걸까?
자살에는 유형이 있는데, 그 중 지하철 자살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틀 간 지하철에서 몸을 내던진 ‘60대 장애인’과 ‘40대 정신질환자’는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려 한 걸까?
자살을 두고 ‘안이하게 죽음을 택했다’라는 말이 과연 옳을까.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안이한 선택이라는 표현이 과연 올바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세상을 어떻게도 살아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최후의 선택은 아니었을까? 그들의 내면의 고통은 어땠을지 감히 그 고통에 다가설 수가 없다. 자살한 이들이 그들만의 세계에서 외롭게 눈물지으며 매일을 보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 편이 시려온다.
그들의 ‘공개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금 되돌아본다.
퇴근길, 만원의 지하철, 혼잡, 불편, 벌금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
이것들 중 가장 먼저 눈길이 가야 하는 것은 불편이나 혼잡, 혹은 벌금이 아니라 당연히 ‘한 사람의 죽음’임을 깊이 되새겨본다. / 배수림 쌩쌩리포터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