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센텀2지구는 판교가 될 수 있나
- 가
안준영 경제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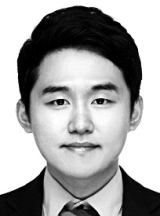
한때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의 40%를 점유했던 노키아는 핀란드 헬싱키의 위성도시인 에스포에 본사를 뒀다. 노키아의 몰락 이후 에스포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대신 유럽 전역의 스타트업이나 IT 업체를 유치하는 데 주력했다. 에스포는 북유럽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떠올랐고, 유럽 전체에서 특허 출원이 6번째로 많은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가 에스포에 방문했을 때 기업 유치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는 기업을 규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무엇이든 도와주고 키워주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일이 우리 시의 1순위 업무”라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이 쇠락하고 스타트업 수혈이 시급한 부산은 에스포의 예전 모습과 많이 닮았다.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꿈꾸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 중에서도 핵심 과제다. 하지만 부산시가 에스포처럼 기업 유치에 명운을 걸었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는 힘들다.
센텀2지구의 단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시에 “센텀2지구의 공동 시행자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공동 시행자 참여 여부가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의 판도를 뒤바꾸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행정의 방향성과 의지의 문제다. 시가 사업의 공동 주체가 된다면 도시공사 수준에서 약속하기 어려운 각종 입주 혜택과 행정적 지원, 정책적 판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앵커 기업’을 움직이려면 지자체와의 약속이 필요하다.
앵커 기업 유치 없이는 서울의 IT 업체들이 쉽게 둥지를 옮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판교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처럼 글로벌 연구시설이 입주한 이후 기업 유치에 불이 붙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산에서 기업하는 여건이 결코 판교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서울과의 접근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인재 수급이나 인프라 등에서 어느 것 하나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
해양수산부 이전처럼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시가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쏟아내야 업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원칙과 규정, 절차만 지키다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반납하게 생긴 지난 수십 년의 행정을 곱씹어야 할 때다.
시는 지난달 방산업체 풍산의 부산 공장 이전이 가시화됐다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냈다. 풍산 공장은 센텀2지구 사업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민 반발로 한 차례 이전 논의가 무산된 바 있기에 고무적인 소식임에 틀림없다.
이는 센텀2지구 사업의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고스란히 사업 비용으로 쌓인다. 센텀2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는 이자만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땅값과 공사비마저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판교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땅값인 조성원가마저 판교를 따라가선 안 된다. 이미 제3판교 수준으로 조성원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과거의 낡은 공식으로 접근하면 센텀2지구는 성공하기 어렵다. 부산시의 절실한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동시에 필요하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