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붓끝에서 흐르는 기억
- 가
김정화 수필가
한때 동양 최대 도자 생산 기업
영도 대한도기, 월 100만 장 제작
피란 시절, 유명 작가 그림 참여
수집가 부부와 오랜 인연 떠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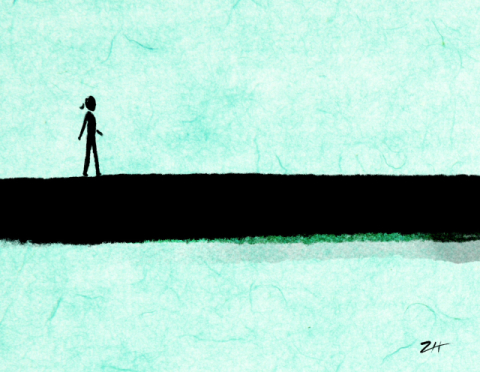
항구도시 부산에서 빠트릴 수 없는 명소가 영도이다. 목도(牧島)라는 옛 이름이 지칭하듯 예전에는 말 사육장으로 유명하였고, 근대유산인 영도다리가 위풍늠름하게 남아 있으며, 요즈음 젊은이들의 여행지로 떠오른 흰여울문화마을도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은 소설 ‘파친코’ 주인공 선자의 고향도 부산 영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한때 조선에서 가장 큰 도자기 공장이자 동양 최대의 도자 생산 기업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가나자와에 있던 일본경질도기가 조선경질도기로 합병하여 본점을 완전히 영도로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해방 후에는 대한도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국 도기의 대부분을 여기서 만들었다. 전성기 때는 월 100만 장씩 도자 접시를 만들었으며 직원 또한 1000명이 넘었다.
반세기도 훨씬 지난 그때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의 관심 밖이며 그나마 남아 있던 공장의 붉은 벽돌 담벼락도 근래에 도로공사를 이유로 말끔히 철거되고 말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 수집가의 끈질긴 노력으로 핸드페인팅 접시들이 개인 수장고에 보관되었다. 주인장은 낯선 방문객에게도 흔쾌히 개방해 준다.
도자 접시에서 과거의 시간이 흘러나온다.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대다수 한국전쟁 피란민들로서 생활고 때문에 대한도기와 인연이 닿았다. 그들 중에는 고종과 순종의 어진화가로 이름을 알린 이당 김은호, 이당과 막역하게 지내던 소정 변관식, 월전 장우성과 목불 장운상, ‘장미의 화가’라는 별칭을 얻은 황염수, 부산의 동양화가 윤재 이규옥뿐만 아니라 푸른 추상을 떠올리게 하는 통영의 전혁림도 칠 년 동안 몸담았으며, 김환기와 이중섭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꽤 놀랍다.
유리문 속에는 생활 접시로 쓰였던 자그마한 백자초화문 접시가 보기 좋게 진열되었지만, 내 눈길을 잡는 것은 대체로 대형 그림 접시들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활궁을 쏘는 여인, 댕기를 휘날리며 널을 뛰고 그네를 타는 처녀들, 바둑을 두는 노인들과 낚싯대를 드리운 조사, 소맷자락 펄럭이는 무희, 물동이를 인 아낙, 베틀에 앉은 촌부…. 여백에 낙관 대신 그려놓은 작가의 별호들도 재미있다. 흔한 종이 그림이 아니기에 귀하고, 식민지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탄생할 수 없었던 작품이라 의미롭다.
가만히 생각하니 내게도 녹색유초화문 접시가 딱 하나 있다. 예전에 지인 중에 접시에 푹 빠진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월급만 타면 낡은 트럭을 몰고 한반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옛 접시를 사 모았다. 그때 나는 그들의 외아들에게 과외를 했었는데, 그 집에 갈 때면 부러 일찍 도착하여 그림 접시들을 구경했다. 내가 유독 관심을 두자 어느 날 그들은 내게 포도 넝쿨이 멋지게 그려진 초화문 접시 하나를 선뜻 건네는 것이다. 내가 쓰는 글도 알알이 영글기를 바란다는 덕담과도 함께.
그런데 오늘 이곳 주인장에게 그들의 근황을 듣게 될 줄이야. 얼마 전에 그들 부부는 그동안 수집한 접시들을 가지고 근사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한다. 숙원을 이룬 감격이 컸으리라 여긴다. 내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한 일 자를 십 년 쓰면 붓끝에서 강물이 흐른다’는 말이 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인가. 대한도기에 흠뻑 빠져 수천 점을 모은 이곳 주인장도, 접시에 미쳐 산천을 다니던 그들 부부도, 돈도 밥도 되지 않는다는 문학에 뛰어들어 밤낮으로 허우적대는 이 가련한 글쟁이도, 십 년쯤이야 가뿐히 견뎌내었다. 모두들 우직하게 외길을 걷고 있으니 분명 이 길 끝에는 유장한 강물이 출렁이리라 믿는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