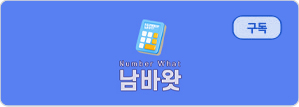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공감] '폭싹 속았수다'와 앙드레 고르의 편지
- 가
이국환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아내와 '폭싹 속았수다' 시청
애순·관식 사랑 공감해 눈물
앙드레 고르가 쓴 책 떠올라
아내에게 쓴 사랑 고백, 유서
우연·기적·운명 합해 사랑
시련·슬픔마저 사랑의 여정

아내와 함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았다. 우리 인생의 서사를 사계절로 구성한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며, 아내와 나는 약속한 듯 오열했다.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떠나가는 남편 관식을 보며 아내 애순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어릴 때 한동네에서 자라 부부가 된 우리는 드라마 속 사랑의 역사에 공감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평소 아내는 내가 자신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를 치며 김광석의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르면, 언젠가 우리도 저 노랫말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나이가 올 거라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어느새 그 나이가 되었다.
드라마가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마른 눈물이 소금 길을 만들어 세안을 다시 해야 했다. 애순은 관식을 먼저 보냈지만, 당신은 건강 관리 잘해서 나를 먼저 보내줘야 한다는 당부를 강조하는 아내를 토닥이며 잠자리에 들었다. 쉬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18년 전에 읽은 책을 떠올렸다. 앙드레 고르의 〈D에게 보낸 편지〉를 읽을 때 나는 40대의 나이였다. ‘어느 사랑의 역사’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생태주의 이론가인 앙드레 고르가 그의 아내 도린에게 쓴 편지 모음이었다.
이 책은 고르가 아내 도린에게 쓴 사랑의 고백이자 유서였다. “세상은 텅 비었고, 나는 더 살지 않으려네.” “우리는 둘 다,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혼자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혹시라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둘이 함께하자고.” 불치병을 앓는 아내를 간호하다 아내의 생이 다함을 예감한 고르는 아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경찰에게 알려달라는 쪽지를 문에 붙여 놓고. 그때 부부의 나이 여든넷과 여든셋이었다.
앙드레 고르는 일자리 나누기와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생태주의를 정립한 이론가이다. 사르트르는 그를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성”이라고 평가했다. 고르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아내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궁금했다. “나는 살면서 많은 책과 연구를 내놓았어요. 그것들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도린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까요? 나는 아내를 알려야 했어요.” 고르는 아내를 기록하고자 했다. 알랭 바디우는 〈사랑 예찬〉에서 우연을 영원으로 기록하여 고정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지 않았던가.
당신과의 만남은 우연이며 내가 좋아하는 당신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기적이다. 우연이 기적을 거쳐 운명에 이르는 과정이 사랑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혼자서는 절대 겪지 않을 ‘차이의 진리’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실존적 위기이다. 특히 결혼과 함께하는 사랑은 긴긴 시련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애순과 관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겪었던 시련과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련을 회피하고 사랑의 달콤한 과실만 취하려는 이들을 알랭 바디우는 비판했다. 사랑은 모험의 여정이며, 그 시련의 여정을 공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철학의 본령은 참된 삶의 가능성을 사유하는 데 있고, 문학의 본질은 그러한 삶의 가능성을 형상화하는 데 있다. ‘폭싹 속았수다’는 드라마, 즉 극문학이 왜 문학의 주요 갈래인지 말해주는 작품이었다. 누구나 사랑을 말하지만, 누구도 좀처럼 사랑을 믿지 않는 시대에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앙드레 고르의 편지를 다시 읽는다.
인간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현존한다. 내가 남긴 책과 논문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으나, 사람들은 훗날 아내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아내에게 부치지 않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곡진하게 기록할 사람은 나이기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