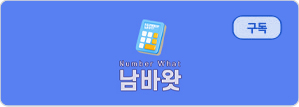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공감] 우물이 있는 자리
- 가
김정화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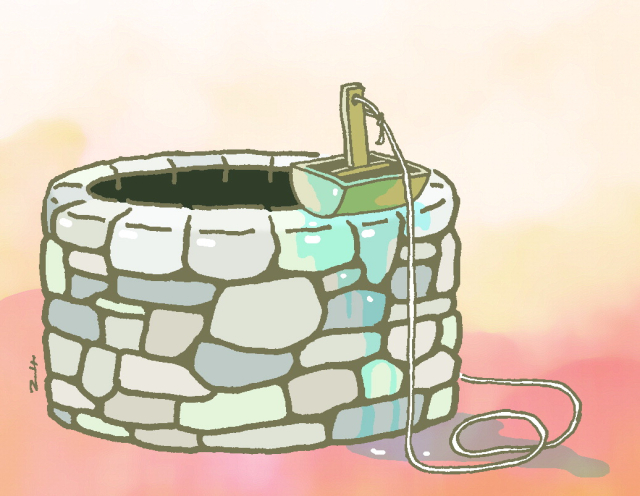
도시 한복판에 우물이 있다. 갈증을 풀어주는 차고 맑은 물이라는 뜻일까. ‘냉정(冷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삼백 년 역사를 지닌 샘터가 있으니 인근 역 이름도 냉정역이라 명명하였다. 흔히 땅을 파서 만든 속 깊은 우물은 아니다. 맨땅을 파서 물이 괴게 하는 토정도 아니며 바위틈 사이로 솟은 석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우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면밀히 따지면 지하에서 솟아나는 자연 샘물이다. 나무 지붕을 이고 있는 낮은 우물 속 물거울을 들여다보니 겹겹으로 쌓인 세월이 고여 있다.
물이 귀하던 시절이 있었다. 고향 마을에도 큰길 모퉁이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새미 또는 새미깡이라고 불렀다. 사시절 물동이 행렬이 늘어섰고 아낙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곳에서 너나없이 물을 길었다. 두레박으로 윗물을 휘휘 헤쳐 젓고 속물을 떠서 벌컥 삼키면 달던 물맛에 허기도 사그라졌다. 시골 소녀들은 수건이나 짚으로 만든 따뱅이를 정수리에 얹고 요령 있게 양철 물동이를 올렸다. 그러면 앞뒤로 잠시 출렁거리긴 했지만 까딱까딱 중심을 잡고 잘도 걸어 다녔다.
공동수도가 들어오고 나서도 윗동네에는 몇 개의 단우물이 더 생겼다. 하지만 큰 강을 경계로 아랫동네에 판 우물들은 한결같이 짜거나 떫은 물이 나왔다. 그제야 어른들은 오래전 바다 자리를 메운 땅이라는 사실을 납득하고 더는 물맛을 기대하지 않았다. 어쨌든 땅을 파면 짜든 달든 샘이 솟았으니 돈으로 물을 사 먹는 작금의 세상이 오리라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재미있는 안내판도 보인다. 물이 청냉하고 감미로워 물맛은 천하일품이며,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는 법이 없고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옛 장꾼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생명수가 되어주었다는 내용이다. 입구 정자에 앉았던 노인 두 분이 말씀을 거든다. 과거 샘터 주변에는 민물장어와 가재가 살았으며, 지금은 사라진 탁주 공장과 콩나물 공장도 이 물로 시원한 술을 빚고 고소한 콩나물을 키워 올렸다고 한다. 한술 더 떠서 일본 막부시대에도 다도에 심취한 지방 제후들이 이곳까지 와서 찻물을 구해갈 정도였다며 찬탄한다.
우물이 있던 장소들을 생각한다. 그 어둡고 은밀한 물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단지 수맥으로만 짐작했을까. 물에 대한 인간의 상상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기억과 회상만으로도 상상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진정한 상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찾아내는 일이겠다. 같은 강에서 두 번 목욕하지 않는다는 경구를 생각해보면 지금 솟는 이 샘물도 봄날 흐르는 낙동강 물도 모두 새로운 물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겠다.
세상 어느 곳에나 고일 수 있는 물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흐르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질 터. 국화 밑에서 나면 국화수가 될 터이고 옥이 있는 곳에서 흐르면 옥정수로 불릴 것이다. 비단 물만 그럴까. 이제 여기 냉정샘은 물의 성분이 달라져 안타깝게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다. 오직 벌레와 새들만 목을 축인다. 더 이상 인간은 맛볼 수 없으니 그저 상상으로만 짐작할 수밖에. 아마도 물맛은 섣달 눈이 녹은 것처럼 맑고 차고 달며 새벽이슬같이 연하고 가벼웠을 것이리니.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이기도 하지만 흐르고 멎고 고임에 따라 정신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도 지녔다. 사람이 어디에서 머무는가 혹은 누구와 더불어 있는가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지듯 어디에서 어떤 물을 먹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도 변할 수 있다고 여긴다. 물을 받들고 물의 탄생지를 성소로 여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다. 그런 까닭일까. 우물 탄생 설화를 가진 지혜로운 옛 왕이 더욱 생각나는 요즈음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