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창의 클래식 내비게이터] 봄 바다에서 듣는 차이콥스키의 '뱃노래'
- 가
음악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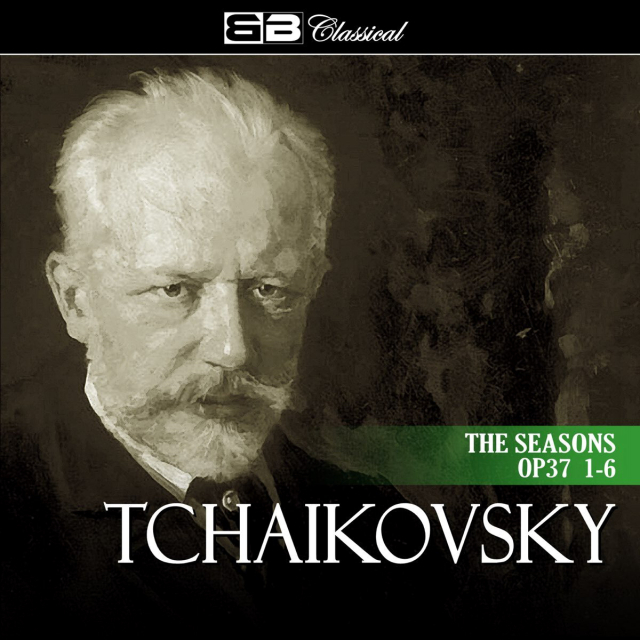 차이콥스키 <사계> 음반 커버. 조희창 제공
차이콥스키 <사계> 음반 커버. 조희창 제공
친구와 함께 기장의 포구로 놀러 나갔다. 바다는 잔잔했다. 바다의 풍경 속에는 배가 있어야 한다. 아련히 멀리 있어 유람선인지 고기잡이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배가 한두 척 떠 있어 줘야 바다의 공식이 완성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어부든 손님이든 누군가는 모종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곁들인다. 그 상상을 입력하여 만든 노래나 기악곡을 우리는 ‘뱃노래(Barcarolle)’라고 부른다.
뱃노래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어업 노동요로서의 뱃노래다. “어기 여차~” 하면서 노를 젓거나 그물을 당기고 고기를 잡는 풍경을 묘사한 노래다. 경기 민요인 ‘자진 뱃노래’, 조두남 작곡의 가곡 ‘뱃노래’, 러시아 민요 ‘볼가강의 뱃노래’ 같은 곡이다.
둘째는 강이나 바다에서 배를 띄워 놓고 즐기는 정취를 담은 음악이다. 우리나라의 ‘진도 아리랑’에 나오는 것처럼, “만경창파(萬頃蒼波)에 두둥둥 배 띄워 놓고, 저 달이 떴다 지도록 놀다 가세”라는 생각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꿈꾸는 최고의 휴식이다. 서양 음악에서의 뱃노래도 주로 이런 마음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네치아의 뱃노래’가 있다. 마치 곤돌라를 저어가는 것처럼 여유 있는 템포와 단조롭게 흔들리는 듯한 ‘강약약’의 리듬으로 편안한 정서를 표현한다.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뱃노래와 베르디 ‘가면무도회’의 뱃노래 장면 등이 있다. 기악에선 멘델스존이 ‘무언가’에 삽입한 3개의 뱃노래가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포레, 알캉, 발라키레프, 글라주노프 등이 피아노곡으로 뱃노래를 썼다.
오늘 기장 해변에서 들은 곡은 차이콥스키의 뱃노래다. 1876년,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있던 차이콥스키는 〈누벨리스트〉라는 음악 월간지에 짧은 피아노곡을 연재하게 되었다. 잡지에는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어울리는 짧은 시도 곁들여 수록하기로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사계(seasons)’인데, 비발디의 작품과는 달리 네 계절이 아니라 열두 달을 다루고 있다. 모든 곡이 다 좋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6월 ‘뱃노래’와 10월 ‘가을의 노래’가 유명하다.
“해변으로 나가자, 거긴 파도가 우리의 다리에 입 맞추리라. 비밀스러운 슬픔을 담아, 별들이 우리를 비춰 주리니.” 알렉세이 플레세예프의 시와 차이콥스키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같이 음미할 수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회색 풍경마저도 일순간 푸른 바다로 바꿔 버리는 마법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콥스키-6월 '뱃노래'-피아노 임윤찬.
※차이콥스키-6월 '뱃노래'-피아노 임윤찬.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